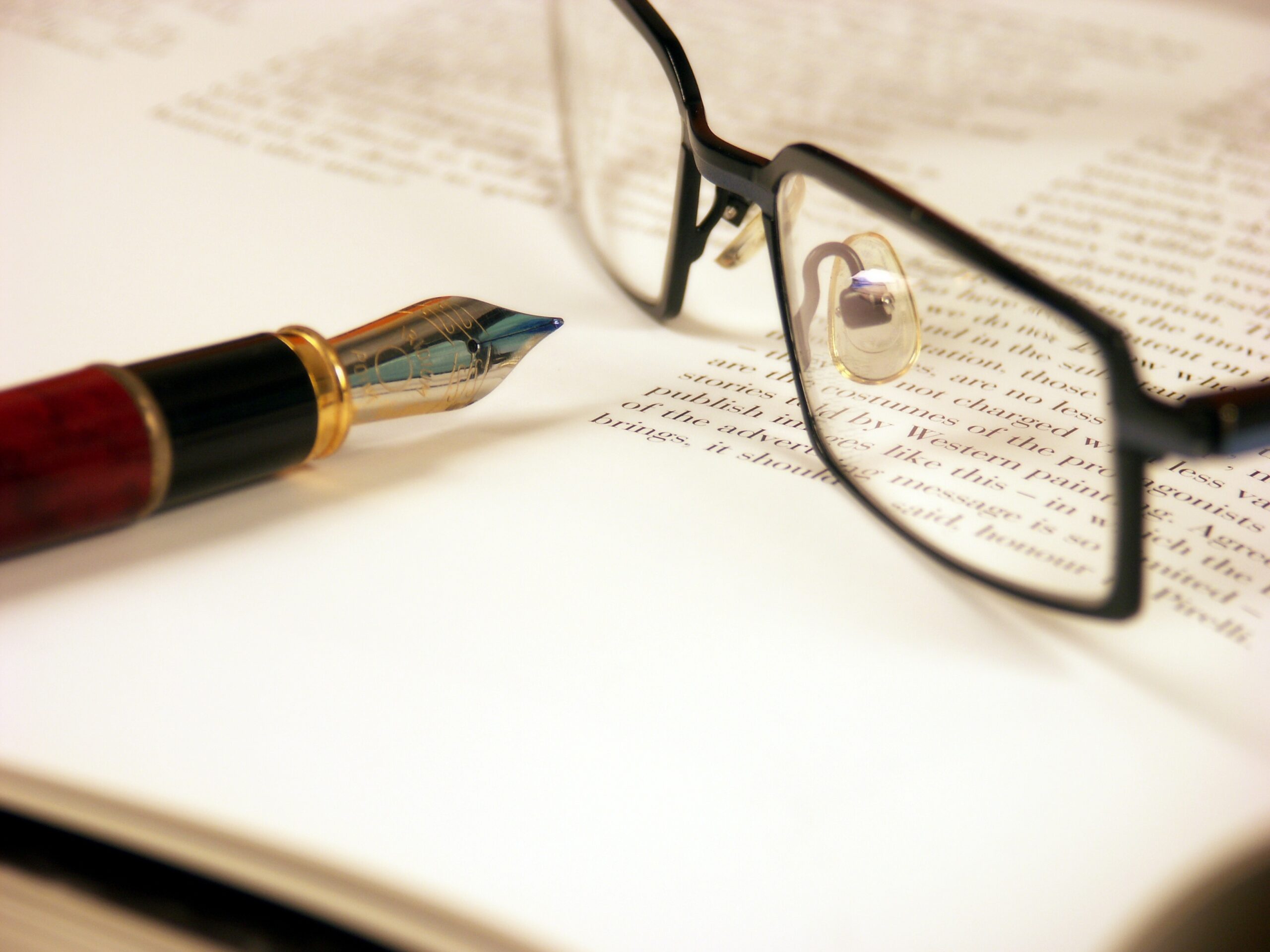밥은 한자의 밥반 (飯)의 발음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그리고 밥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적인 조, 피, 기장등을 볶아서 먹었으며 그후 토기의 발달로 이들 곡물에 물을 부어 끓여 “국”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이르러 벼농사의 발달로 쌀을 시루에 쪄서 먹는 “떡”의 형태에서 (고구려 안악 벽화) 철기가 발달됨에 따라 철제 솥에 쌀을 안쳐 밥을 지었다 한다 (삼국 사기).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밥은 고작 2,000년전 개발된 조리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사람인 공자, 진시왕 등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으며 당시의 주식은 밀, 기장, 콩등이였다.
이러한 밥은 임금의 상에 오르면 “수라”였고 양반의 상에 놓이면 “진지”가 되며 평민의 상에 있으면 “밥”이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라 했고 제사상에 오르면 “진메”라 하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쌀밥은 귀한 식품으로 여겨 “옥식” 또는 “옥미”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밥과 관련하여 콩밥 (감옥에 감), 짬밥 (군대 밥, 특정 분야 경력), 떡밥 (복선을 깔아둠), 밑밥 (특정 목적을 가지고 미리 손을 써둠)등의 은어로 사용되는 찬밥 (푸대접의 대명사) 신세가 되었고 더러는 눈치밥 처지가 되었다.
다음은 “하루 세끼의 밥”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왜 조물주는 인간이 하루 세끼를 먹게 했는가 라는 불평 (?)과 함께 3일에 한번 먹게 하든가 아니면 하루 한끼만 먹게 해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고대 인류는 주로 수렵과 채집을 통하여 음식을 구했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매우 유동적 이었다. 그러나 농업의 발달로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일찍 일어나 일하고,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일 마치고 저녁 먹는 습관이 생겼으며 그후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일정한 식사 시간이 정해졌다.
본래 식사를 조석이라고 하는것을 보면 하루 두끼가 일반적 이었던것 같다. 점심이라는 단어는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데 뱃속에 점을 찍을 정도의 간식이라는 뜻으로 조선 선조시 오희문의 저서 “쇄미록”에 점심은 간단히 먹는 것이라고 했고 1,800년 이규경이 지은 “오주 연문 장전 상고”에는 2~8월간 7개월은 하루 세끼, 9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5개월은 하루에 두끼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 왕실에서는 하루 5끼 식사를 했는데 이른 아침 간단한 식사 (죽등), 오전 10시경 아침(수라), 점심은 간단한 요기, 오후 5시경 저녁 수라, 그리고 밤참을 먹었다 한다.
또한 육체 노동이 심한 노동자나 농번기의 농민들은 통상 하루 세끼 식사 이외 두번의 새참 (사이참의 준말)을 더하였는데 아침과 점심 사이 (새참), 점심과 저녁 사이 (술참), 그외에 밤참도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시인 장우익의 “세끼밥의 이변”에서 “사람은 왜 하루 세끼를 챙겨 먹어야 했을까? 세끼를 먹었더니 머리가 좋아졌다는 에디슨의 말에서 유래된 식습관이라 전해진다 (중략). 비만이 문제인 요즘 굶어가며 약 먹고 땀빼느라 돈드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하루에 쌀 세말, 숫 꿩 9마리를 먹었다는 신라 태종 김춘추와 밥그릇이 국대접과 구분이 안되었다는 명성 왕후등 대식가들은 이런 세태를 보고 무어라 말할까 궁금하다.
특히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고 모든게 “밥으로 통한다”고도 한다. 먼저 “밥심으로 산다”는 뜻의 밥심은 밥과 힘의 결합어로 밥을 먹어 얻는 (생기는) 힘을 표현한 우리의 고유어이다.
그러나 밥심은 한국인의 삶에서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전적 뜻 이상의 문화적 정신적, 희망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문화적 의미로는 가족 공동체의 상징으로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밥을 먹이고 나누는 행위는 정과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다. 다음 정신적 의미로는 밥심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끈기와 인내심을 지속한다. 흔히 어른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밥을 잘 먹어라, 밥심이 있어야 산다”고 하였다. 그리고 밥심은 “먹고 살면 된다”는 희망적 메세지를 전달한다. 무슨 일을 시작할때 “밥부터 먹자”는 말은 단순히 배고품을 채우는 것 이상의 희망적 표현이다.
또한 밥심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한식과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 달성에 있는 경서 중학교에서 2024년 12월 9일 “합심, 밥심, 안심”행사를 가진 것은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밥심”을 알려주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다음 한국인은 “모든게 밥으로 통한다”는 뜻은 삶의 대부분이 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밥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밥 먹는 삶과 밥의 일차원적 관계를 함의하고 있다.
그래서 밥으로 통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은데 밥 먹자로 부터 밥 먹었나 (안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감사), 밥맛 없는 사람 (재수 없음), 저래서 밥은 먹겠나 (한심함), 밥값은 해야지 (제구실), 야 밥팅아 (멍청함),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심각한 상황), 그게 밥 먹여 주냐 (만류), 밥맛 떨어 진다 (냉정), 밥만 잘 쳐먹드라 (비꼴때), 나랏밥 (봉급), 밥벌이 (생계), 밥줄 (소득 원천), 죽도 밥도 아니다 (불분명)등 수없이 많다.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밥의 재료인 쌀은 농부들이 씨나락을 항아리에서 싹을 티울때와 묘판에 뿌려 뿌리를 내는 정성과 이앙후 세벌의 논매기 (아시, 두벌, 만논)와 피사리, 농약주기, 벼베기, 탈곡, 정미등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일미 칠근”이라는 말이 생겼다. 즉 한톨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가 땀을 일곱근 흘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쌀을 귀하게 여기고 아까워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부산 농협에서 상생과 나눔을 위한 사회 공헌자에게 주는 “일미 칠근상”을 제정 (2022, 2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끝으로 80대 중반의 필자는 수십년 전부터 안사람이 아침에는 국 (주로 콩나물)을 꼭 끓여주고 점심, 저녁등 세끼는 물론 세네시경 떡등 간식을 주는데다 절기 (정월 보름, 복날, 동지등) 음식과 명절 음식, 제철 과일과 채소를 챙겨주어 이때까지 아픈데 없이 지내는데 이 기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밥심은 아내에게서 부터 나오고 식복은 처복에서 나오고 처복은 모든 복중 최고라고 생각한다.